top of page
김재석
Back then, there was a kind of ritual among my schoolmates. No matter what games we played, the final stage of the night was always <Gals Panic S2>. Gals Panic, put simply, was a territory-capture style game where you control your marker in 8 direntions-up, down, left, right, and diagonally-to claim areas and win.
bottom of page


![[Editor's View] 네트워크 시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협동의 의미에 대하여](https://static.wixstatic.com/media/d03518_d7b2758a51c7467cb550da0d64068a8f~mv2.png/v1/fill/w_145,h_137,al_c,q_85,usm_0.66_1.00_0.01,enc_avif,quality_auto/Image-empty-state.png)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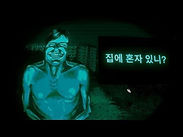


![[대담회] 같이 논다는 것의 의미: 골목에서 온라인까지](https://static.wixstatic.com/media/d03518_611dc4f745c44aaa8b4cfe8893be0b7c~mv2.avif/v1/fill/w_244,h_137,al_c,q_80,usm_0.66_1.00_0.01,enc_avif,quality_auto/Image-empty-state.avif)

